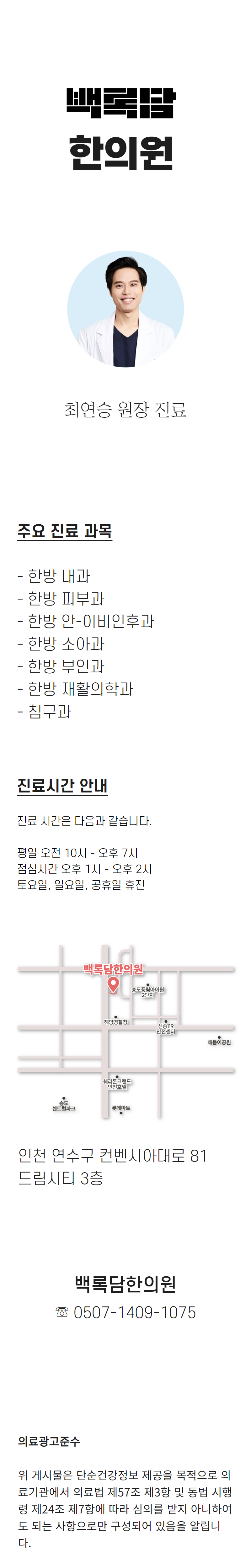약을 끊으면 더 심해지는 피부염, 범인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가렵고 따가워요. 진물까지 나는데, 처방받은 연고를 바를 때만 잠깐 괜찮고 끊으면 더 뒤집어집니다."
지난 1년간, 20대 중반의 연구원 A씨의 삶은 얼굴에 타오르는 불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 볼에서 시작된 작은 트러블은 팔자주름, 입가, 눈가를 넘어 목까지 번져나가며 그녀의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
피부과에서는 아토피나 주사피부염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진단은 어려웠습니다.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는 잠시 불을 덮어주는 듯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을 끊으면 이전보다 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 즉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리바운드 현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문제의 진짜 원인은 화려하게 증상이 드러나는 얼굴이 아닌, 우리 몸의 가장 깊고 조용한 곳, 바로 '하복부'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 최상층에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1층 보일러실의 완전한 순환 펌프 고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A씨의 몸이 보내는 세 가지 명백한 신호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첫째, 극심한 온도 불균형입니다. A씨는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얼굴과 상체는 항상 뜨거운 열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몸의 상하 순환 고속도로가 막혀버린 상열하한(上熱下寒) 상태로 봅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실패로 인한 말초 혈관의 수축과 상체 혈류 쏠림 현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몸속 염증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변비입니다.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 간신히 화장실에 갈 정도로 심각한 변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하수구인 대장이 꽉 막히자, 배출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와 열독(熱毒)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그대로 얼굴의 염증을 폭발시키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
셋째, 하복부의 혈액순환 정체입니다. 심한 생리통과 덩어리지는 생리혈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마저 끈적하게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이라 부르는데, 이 어혈은 하복부를 더욱 차갑고 꽉 막히게 만들어, 병적인 열이 위로 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완성합니다. |
만약 A씨의 문제가 단순히 피부의 문제였다면,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에 꾸준히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병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반증 단서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본질은 얼굴의 불을 직접 끄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1층의 순환 펌프', 즉 하복부의 순환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도핵승기탕(桃核承氣湯)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피부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순환 체계를 바로잡는 시스템 엔지니어에 가깝습니다.
[용어 해설: 도핵승기탕(桃核承氣湯)]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으로, 하복부의 어혈과 대장의 열독이 결합된 '하초축혈(下焦蓄血)' 상태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순환을 재개하여 몸 스스로 균형을 되찾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처방 속의 '대황'과 '망초'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막혀 있던 대장의 열독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시키고, '도인'은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하복부의 끈적한 어혈을 깨뜨려 녹여냅니다. 마지막으로 '계지'는 말초 혈관을 확장하여 막혔던 상하 순환의 고속도로를 뚫고, 얼굴로만 치솟던 열을 다시 손발 끝까지 전달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어혈 푸는법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래가 뚫리고, 순환이 다시 시작되면, 원인 모를 얼굴 피부염 재발을 일으키던 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내려갈 것입니다. 이는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
[마지막 질문] 이 새로운 관점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전문가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나요?'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제 몸의 상하 순환 불균형을 개선하고, 하복부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와 같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