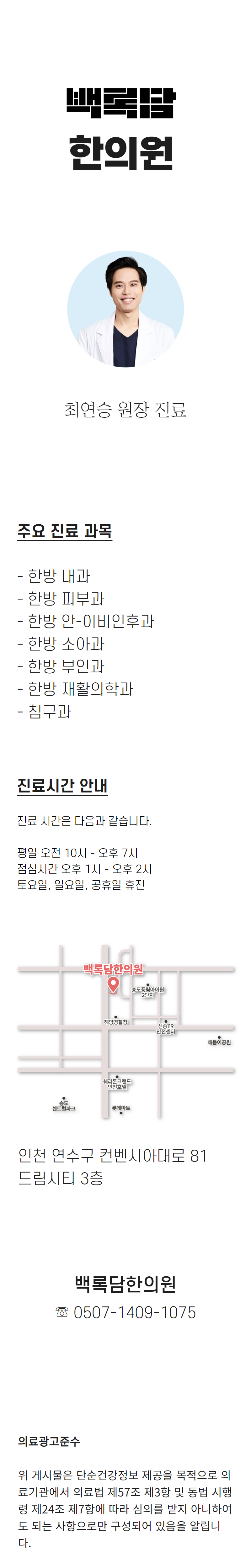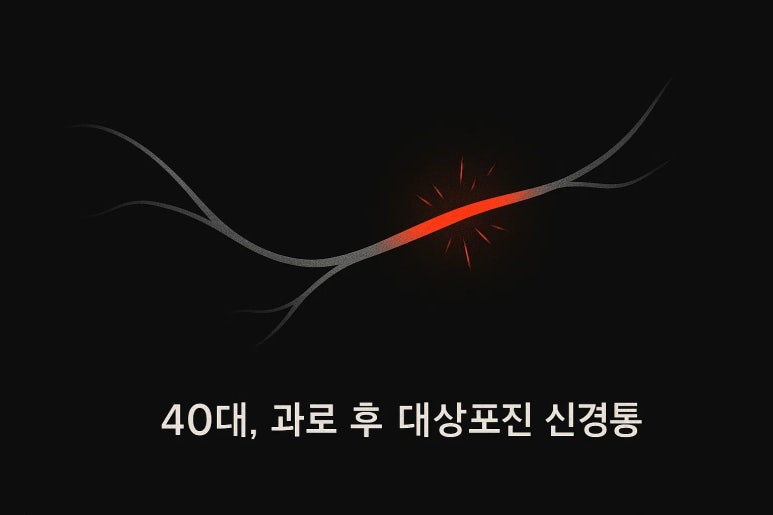옷깃만 스쳐도 비명을 지르는 피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
"원장님, 정말 이상해요. 대상포진 물집은 다 아물었는데, 왜 살갗은 더 아플까요? 마치 옷 안쪽에 사포를 붙여 놓은 것처럼,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는 듯한 대상포진 통증이 느껴져요." |
제가 진료실에서 40대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분들을 뵐 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바로 이처럼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힘든 감각을 설명하려 애쓰실 때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피부. 하지만 그 아래에선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
[CASE] 프로젝트를 마친 팀장님의 이야기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40대 중반의 팀장님도 그러셨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극심한 과로 후 대상포진이 옆구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고통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
|
"신경과에서 처방해준 약(가바펜틴)을 먹고는 있어요. 먹으면 좀 멍하고 잠이 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통증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의 끝일까요? 평생 이렇게 약에 의지해야 하나, 덜컥 겁이 나요." |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
아니, 바이러스는 사라졌다면서요. 피부도 깨끗해졌는데, 대체 왜 계속 아픈 걸까요?'
저는 이 현상을 '산불이 휩쓸고 간 숲에 남겨진, 과민해진 경보 시스템'에 비유하곤 합니다. 큰불(대상포진)이 나서 숲(우리 몸)의 많은 나무(세포)들이 불타고, 숲을 지키던 감시 시스템(신경)까지 손상된 상황이죠.
불은 꺼졌지만, 이제 경보 시스템은 작은 바람(옷 스침)이나 이슬비(온도 변화)에도 놀라 온 숲이 떠나가라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병성 통증의 본질입니다. 면역력 저하 증상이 남긴 신경의 깊은 상처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피부뿐 아니라,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절 자체를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망가진 통신선만 남은 셈이죠.
이 손상된 신경이 외부의 자극을 왜곡하고 증폭시켜 뇌에 '통증'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
[한의학의 관점: 어혈(瘀血)] 한의학에서는 이 '망가진 전쟁터'를 복구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혈 제거란, 단순히 멍든 피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로 길이 끊기고 폐허가 된 숲에 구호물자가 닿지 못하듯, 손상된 신경 주변의 미세한 혈액순환이 막혀 회복이 더뎌지는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경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회복이 더뎌지고 과민 상태가 유지되는 현대적 해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런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통증의 양상이 환자분들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마다의 언어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
[새로운 질문의 시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의 '언어'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로 베는 듯한', '전기가 오르는', '벌레가 기는 듯한' 그 모든 감각은 내 신경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경보를 끄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과민해진 경보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