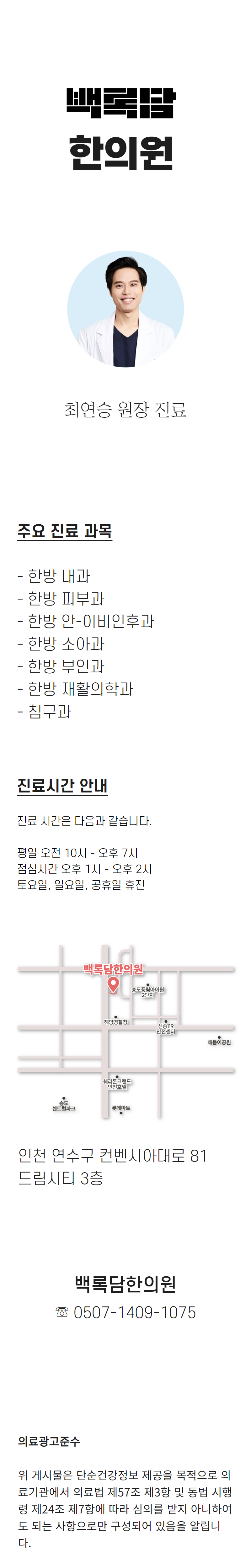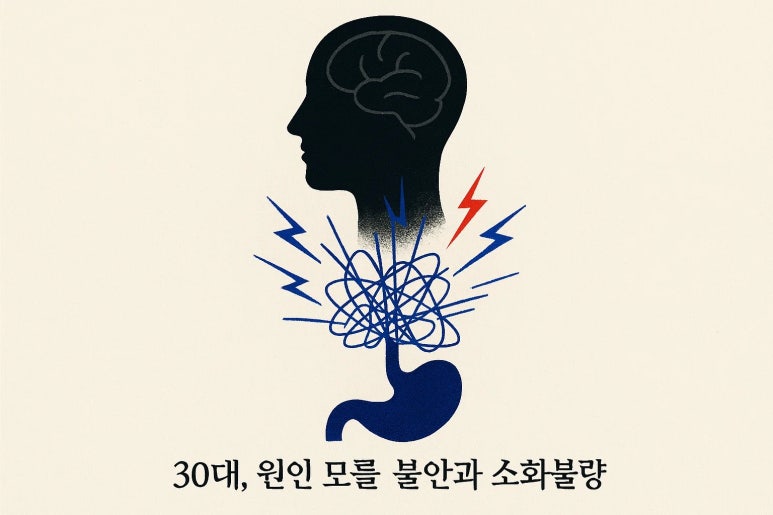뇌 검사에선 정상인데... 반복되는 공황발작, 범인은 '딱딱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온몸을 덮쳐요." |
|
CASE STUDY |
|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공황발작으로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뇌 MRI와 심전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로 진단하고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 성분)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약효가 떨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불안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습니다. |
그런데 A씨에게는 한 가지 오래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만성 소화불량이었습니다. 늘 명치가 답답하고, 조금만 신경 써도 체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뇌에 아무런 구조적 문제가 없고, 심장에도 이상이 없는데 왜 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걸까요? 신경안정제가 뇌의 과민반응을 잠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무엇이 뇌에 그토록 강력한 '거짓 경보'를 울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기존의 설명 방식이 마주한 한계이자, 우리가 탐색해야 할 새로운 실마리입니다. |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뇌'가 아닌 '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화재경보기가 계속 울리는데, 원인이 연기가 아니라 경보기 자체의 전기 합선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와 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정보 고속도로는 바로 '미주신경(Vagus Nerve)'입니다. 장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이 신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됩니다.
|
📖 용어 해설: 담적(痰積) 한의학에서는 A씨처럼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로 인해 위장 주변 조직이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담적(痰積)'이라고 부릅니다. '담(痰)'이란 몸의 진액이 스트레스나 염증으로 인해 끈적하게 변한 비정상적인 체액을, '적(積)'은 그것이 쌓여 덩어리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배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물의 흐름을 막고 수압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것처럼, 담적은 위장벽에 쌓여 소화액과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합니다. |
이렇게 형성된 담적은 물리적으로 위장 주변을 압박하고, 여기서 발생한 염증성 물질들은 미주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미주신경 입장에서는 장에서 원인 모를 '위기 신호'가 계속 올라오는 셈입니다.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할 때, '소화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존의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계를 총동원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 위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황발작의 숨겨진 기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안정제로 뇌를 안정시키는 것은 울리는 경보기의 소리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보기를 울리는 근본 원인인 '위장의 담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비상벨이 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안장애 환자들이 위장관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며, 이는 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
만약 당신이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반복되는 불안과 신체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뇌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내 몸의 경보 시스템을 자꾸만 울리게 만들까?"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없앤다'는 추상적인 목표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편안한 속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난다면, 이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약이 불안을 줄여주나요?"를 넘어섭니다. 대신, "제 몸의 만성적인 염증과 긴장을 풀고, 장에서부터 뇌까지 이어지는 소통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